-
Read More

211102 역사문화탐방이야기(37) - 돈보다 사람 최영 장군 (고양시)
211102 역사문화탐방이야기(37) - 세상을 향해 돈보다 사람이라 외친다. (최영장군 / 파주) 마음을 다스리는 것 중의 하나는 욕심을 비우는 것이다. 차지하고 싶은 영역이 많을수록 잠이 오지 않는 날도 많을 것이다. 세상사 많은 영역에서 다투는 이치는 비슷... -
Read More

210401(1/27) 역사문화탐방이야기(36) - 도전과 용기 (원주 강원감영)
210401(1/27) 역사문화탐방이야기(36) - 도전과 용기 (원주 강원감영) 원주 감영을 다녀온다. 그동안 너무 많이 달렸나 보다. 사무실 구축, 커피바리스타 자격교육, 그리고 주5일 택배배송업, 주 2틀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을 쉬지 않고 달려와서인지 몸과 ... -
Read More

201230 역사문화탐방이야기(35) - 삶의 가치관 (조선24대 왕 헌종)
201230 역사문화탐방이야기(35) - 삶의 가치관 (조선24대 왕 헌종) 항상 되돌아 본다.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내삶의 하루 하루 역사가 중요하다.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규정하고 미래의 내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. 우리나... -
Read More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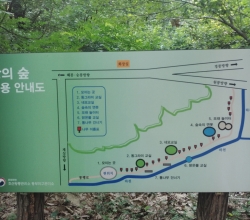
190702 역사문화탐방이야기(34) -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야 하는 삶 "영릉 영조와 정순왕후를 찾아서"
190702 역사문화탐방이야기(34) -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야 하는 삶 "영릉 영조와 정순왕후를 찾아서" 어떤면에서 우리는 좋은 조건의 삶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. 그러다보면 어느새 되돌아 갈 수 없는 곳에 있어 원래 자리로 되돌아 가기에는 ... -
Read More

181226 역사문화탐방이야기(33) - 이순지선생묘 (남양주시 화도읍)
181226 역사문화탐방이야기(33) - 이순지선생묘 (남양주시 화도읍) 과학자 이순지 조선시대의 과학자로 제일 많은 기억을 해주고 있는 장영실에 비해서 이순지의 역할이 비교적 컸는데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사료를 찾아보니 이순지라는 ... -
Read More

181115 역사문화탐방이야기(32) - 청풍김씨 (남양주시 와부읍)
181115 역사문화탐방이야기(32) - 청풍김씨 (남양주시 와부읍) 일가 가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. 그만큼 뿌리가 튼튼하면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"행복한 사람도 아픔은 있습니다. 다만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을... -
Read More

181010 역사문화탐방이야기(31) - 유강 및 기계유씨묘역 (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)
181010 역사문화탐방이야기(31) - 유강 및 기계유씨묘역 (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) 어쩌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만큼 신기한 일도 없습니다. 두 다리로 걷고, 호흡하며 두 눈으로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는 것만큼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... -
Read More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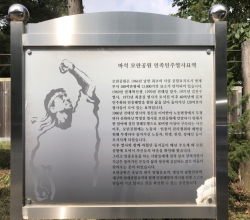
180727 역사문화탐방이야기(30) - 삶 그리고 지속함
180727 역사문화탐방이야기(30) - 삶 그리고 지속함 고려신문 김창호 대표가 끊임없이 언론탄압에 맞서 살아온 이형관 군산대 학생기자에 대한 인식을 시켜준 덕에 제일 먼저 찾은 곳입니다.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 서슴없이 그 길로 가게 만들었... -
Read More

180704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9) - 능원대군 이보를 만나다
180704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9) - 능원대군 이보를 만나다 장마로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. 화도읍 녹촌리 궁촌테니스장 옆에 위치한 능원대군 이보...그가 바라본 세상이 흡사 오늘과 같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햇빛이 비취... -
Read More

180216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8) - 청강 이제신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기리며
180216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8) - 청강 이제신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기리며 남양주 수동면 송천리를 그동안 많이 다니다가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된 명달리...늘 지나다니는 길입니다. 화서 이항로의 기념관은 지난 번 고종황제의 증손녀 이홍 공주와 함께 다녀... -
Read More

171121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7) - 태릉에서 산책길 넘어 강릉(명종)을 찾다
171121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7) - 태릉에서 산책길 넘어 강릉(명종)을 찾다 날이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. 문정왕후가 그렇게도 아끼며 왕으로 세우기 위해 혈투를 마다하지 않았던 과거속으로 가 봅니다. 연산군을 밀어내고 반정에 성공한 중종은 통치기간 내... -
Read More

170915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6) - 장조(사도세자)를 보내고 아들을 지킨 혜경궁홍씨
170915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6) - 장조(사도세자)를 보내고 아들을 지킨 혜경궁홍씨 자식을 사랑하는 공통언어 부모의 희생은 시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. --- 융릉은 추존 장조의황제와 헌경의황후 홍씨의 능으로 합장릉의 형태이다. 융릉은 1789년(정조 13)에... -
Read More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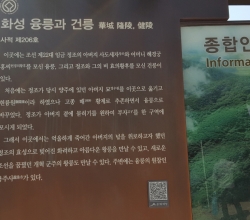
170908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5) - 당쟁이 극심하던 시대를 살아간 정조를 찾아서
170908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5) - 당쟁이 극심하던 시대를 살아간 정조를 찾아서 아버지 영조는 할아버지 숙종의 서장자(차남)로 적통인 경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. 영조는 잠재적인 왕위 계승이 가능한 인물이었지만, 수많은 위기속에서 경종 사후 ... -
Read More

170831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4) - 한 시대를 호령했던 여인 문정왕후 (서울 노원구)
170831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4) - 한 시대를 호령했던 여인 문정왕후 (서울 노원구) 문촌 장익수(메인즈) 오랫동안 탐방기를 쓰지 않고 묵혀 두었다가 이제서야 기억을 더듬어 글을 쓰게 되네요. 오늘은 여인천하의 시대를 열었던 한 여인에게 다가가 봅니다. ... -
Read More

160506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3) - 철종을 낳은 전계대원군 (경기도 포천시 선단동)
160506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3) - 철종을 낳은 전계대원군 (경기도 포천시 선단동) 문촌 장익수(메인즈) 살아가다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, 불가항력적인 일, 그리고 쌓여진 안좋은 기억들로 혼란스러운 일이 반복되는 ... -
Read More

160428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2) - 원주변씨 뿌리인 변안렬선생 묘소를 찾아서..(남양주시 진건읍)
160428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2) - 원주변씨 뿌리인 변안렬선생 묘소를 찾아서..(남양주시 진건읍) 문촌 장익수(메인즈) 변안렬 장군...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고려시대의 인물입니다. 탐방을 통해 그분을 더욱 구체적... -
Read More

160421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1) -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후 왕권을 이어 받은 순조를 찾다 (서울시 내곡동)
160421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1) -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후 왕권을 이어 받은 순조를 찾다 (서울시 내곡동) 문촌 장익수(메인즈) 영조, 정조의 통치아래 조선의 정치가 꽃을 피웠던 시절이 지났습니다. 영조와 한 평생을 같이하며 권력의 정점에서 숨고르기를 ... -
Read More

160416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0) - 실학과 청풍김씨의 뿌리인 김육선생 묘소를 찾아서..(남양주시 삼패동)
160416 역사문화탐방이야기(20) - 실학과 청풍김씨의 뿌리인 김육선생 묘소를 찾아서..(남양주시 삼패동) 문촌 장익수(메인즈) 4월은 이 땅의 민주화를 기억하는 달 김육은 백성의 고통을 몸소 눈으로 보고 대동법 시행을 주장했던 백성편에 있던 관리였습니다... -
Read More

160414 역사문화탐방이야기(19) - 조선 건국에 결정적 기여를 한 태종 이방원을 찾아가다 (서울시 내곡동)
160414 역사문화탐방이야기(19) - 조선 건국에 결정적 기여를 한 태종 이방원을 찾아가다 (서울시 내곡동) 문촌 장익수(메인즈) 서울 나들이가 자주 있습니다. 양재동을 다녀가면서 들려야 하는 왕릉 중 하나인데 피일차일 미루다가 이제서야 방문하게 됩... -
Read More

160410 역사문화탐방이야기(18) - 수석리토성과 문강공 조말생 후손 묘소를 다녀오다 (남양주시 수석동)
160410 역사문화탐방이야기(18) - 수석리토성과 문강공 조말생 후손 묘소를 다녀오다 (남양주시 수석동) 문촌 장익수(메인즈) 매번 지나 다니는 길에 수석리 토성 이정표를 보았습니다. 오늘은 꼭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산을 오릅니다. 남양주시 수석동...
